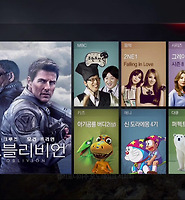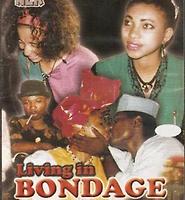티스토리 뷰
놀리우드 야심작 <태양의 절반>
5월 9일 저녁 7시 뉴욕 링컨센터 월터 리드 극장에 들어선 비이 반델레 감독은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을 바라보며 지난 9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숨죽이며 영화의 상영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 표정에 그동안 그가 설득해야 했던 얼굴들이 겹쳐 보였다. 그것은 고독한 인내와 설득의 과정이었다.
그가 영화의 원작자인 소설가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를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런던에서였다. 두 사람은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라는 공통점으로 금세 친해졌다. 한 사람은 소설로, 한 사람은 연극으로 영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1990년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온 반델레는 이곳에 정착해 크고 작은 상을 받으며 성공한 극작가가 되었지만 늘 자신의 모국 나이지리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마침 아디치가 1967년부터 1970년 사이 벌어졌던 나이지리아 내전을 소재로 한 소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을 때 반델레는 드디어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소설이 완성되면 기필코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2006년 소설이 출간됐고 오렌지상을 수상할 정도로 문단의 평가도 좋았다. 나이지리아 버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별칭도 붙었다. 반델레는 친구이자 파트너인 스코틀랜드인 여성 안드레아 칼더우드에게 프로듀싱을 부탁했다. 소설의 비전을 담으려면 영화는 기존 놀리우드 영화보다 스케일이 훨씬 커야 했다. 그녀는 5년 동안 12명의 투자자를 모았다. 12명은 기존 놀리우드 시스템 밖에서 모았는데 주로 놀리우드에 투자하고 싶던 라고스의 은행가들과 일부 영국인이었다.
2012년 마침내 제작사가 꾸려지고 영화화가 결정됐다. 놀리우드의 야심에 동의한 아프리카계 할리우드 배우들이 선뜻 나섰다. <노예 12년>의 치웨텔 에지오포, <미션 임파서블2>의 탠디 뉴튼이 주연배우로 확정됐다. 문제는 촬영이었다. 영국 투자자와 제작사는 남아공에서 촬영하기를 원했다. 나이지리아엔 크고 작은 종교분쟁이 끊이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과 원작자는 나이지리아를 고집했다. 나이지리아의 아픈 역사를 담은 나이지리아 영화를 다른 곳에서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설득 과정 끝에 제작진이 선택한 곳은 나이지리아에서 비교적 치안이 확보된 남동쪽 크로스 리버주의 칼라바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인터넷도, 전화도, 화장실도, 심지어 수돗물도 없는 곳이었다.
인간의 삶에서 물의 중요성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지에 도착한 배우와 스탭들은 '아무것도 없는'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영화 제작진은 나이지리아인을 포함해 영국, 남아공, 미국, 인도,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폴란드 등 다국적으로 꾸려져 있었다.
결국 물 때문에 감독과 주연배우를 포함한 40여명이 당뇨병과 장티푸스에 걸리고 만다.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 존 보예가는 열이 48도까지 올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설상가상으로 제작비 문제로 8주의 촬영 스케줄은 5주로 줄어들었다. 주연배우인 탠디 뉴튼은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실제로 아팠던 경험이 아픈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대인배'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이지리아 역사상 최대 제작비(89억원)가 투입된 영화가 무사히 완성된 것은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마침내 극장에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배급사와 제작사 로고가 나타났다. 맨해튼에 모인 관객들은 숨죽이며 새로운 나이지리아 영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올해 뉴욕 아프리카 영화제엔 40여편의 영화가 초청됐지만 모든 관심은 이 영화에 집중됐다. 곧이어 영화의 제목 <태양의 절반(Half of a Yellow Sun)>이 스크린에 떴다.
영화는 나이지리아 내전을 일으킨 이그보족이 비아프라 공화국을 세워 독립을 시도하는 격변의 시기, 쌍둥이 자매의 운명을 그렸다. 두 자매 올라나와 케이넨은 전쟁이 발발하자 각각 다른 편으로 참전했다가 결국 화합하는데 이 과정을 반쪽의 태양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전쟁이 갈라놓은 운명이라는 주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뿐만 아니라 <닥터 지바고> 혹은 <레오파드>와도 닮았다.
탠디 뉴튼이 분한 올라나는 외국 유학파인 신식 여성으로 등장하는데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엄마는 올라나를 마녀라고 부른다. 1960년대 나이지리아 격동기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한국과 비슷한 갈등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감독은 1960년 영국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시기 엘리자베스 2세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는 장면 등의 뉴스 클립과 지도를 영화 초반에 삽입해 사실성을 높였다. 그러나 영화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두 자매의 멜로드라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양의 절반>은 놀리우드가 아프리카를 넘어 할리우드 주류영화와 경쟁하겠다는 야심 속에 탄생한 대작이다. 영화는 촬영과 편집까지 수개월 걸렸는데 이는 2주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다른 나이지리아 영화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놀리우드 자체의 힘을 넘어 세계 각국의 재능이 뭉쳐 탄생한 영화지만, 나이지리아 자본으로, 나이지리아 감독이, 나이지리아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나이지리아에서 촬영해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놀리우드 영화로 보는 데 이견은 없다.
희망적인 결말로 마무리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극장에 불이 켜졌다. 객석에서 “브라보!” 함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델레 감독은 자리에서 일어서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때 영화제 관계자가 다가와 귓속말로 모든 상영회차가 매진돼 추가상영을 준비중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순간 그는 나이지리아를 대표하는 첫 영화가 이제 막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뒷 얘기 >>
영화는 2013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다. 올해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소규모 개봉했고 7월엔 나이지리아에서 DVD로도 출시됐다. 미국 흥행수입은 4만4000달러로 신통치 않았고, 영화팬들이 매기는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도 52%(100% 만점)에 불과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태양의 절반>의 탄생은 놀리우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다. 대형 화면을 노리고 제작된 <태양의 절반>을 계기로 나이지리아 주요 도시 쇼핑몰엔 멀티플렉스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놀리우드는 더이상 잠재력의 대상이나 질낮은 싸구려 영화가 아니다." 나이지리아에서 40년간 영화를 만들어온 제작자 툰데 켈라니의 말은 놀리우드의 자신감을 대변한다.
>> 세계 2위 영화대국 놀리우드를 아시나요? (1) 아프리카 커넥션
- Total
- Today
- Yesterday